후후후의 숲 - 조경란 짧은 소설
 | 후후후의 숲 -  조경란 지음, 이정환 그림/스윙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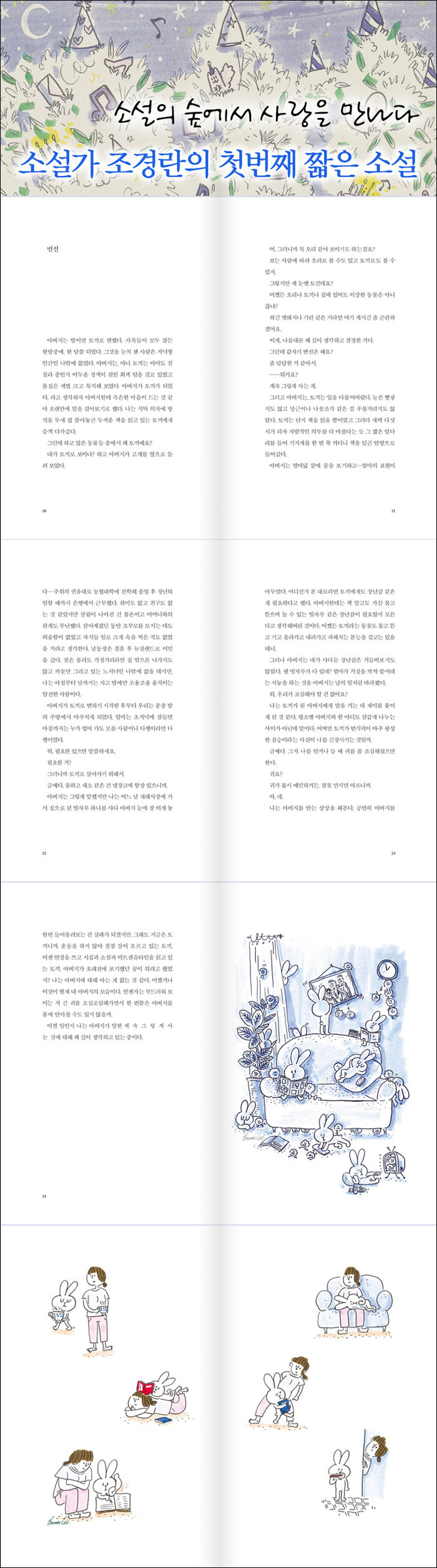
가장 따뜻한 빛을 닮은 이야기들
5권의 장편소설과 6권의 소설집을 펴낸 등단 20년차 소설가는 어느 날 난데없이 선언했다.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짧은 이야기들을 써볼래. 짧지만, 아주 좋은 이야기들. 물론 재미도 있고 말이야.”
작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7개월 남짓 매주 한 편씩 썼고, 평균 원고지 10매 내외 분량의 아주 짧은 이야기 31편을 완성했다. 단 한 글자의 군더더기도 없이 말끔하게 쓰인 이야기들은 재미는 말할 것도 없고, 뜻밖의 웃음과 잔잔한 감동까지 안겨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출판계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장편소설에 에너지를 집중해왔고, 이로 인해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단편소설은 점점 더 소수 문학 독자들의 장르로 축소되었다. 물론 소설의 전통 안에서 서사는 제1의 지위를 차지하지만 짧은 분량 안에서 서사의 완결성과 문학적 완성도를 이뤄내는 단편소설은 장편이 줄 수 없는 쾌감이 있다.
‘짧은 소설’은 이러한 단편의 매력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장르다. 프랑스 문학에서 유래한 ‘콩트’는 엽편소설(葉片小說), 장편소설(掌篇小說, 손바닥소설), 초단편소설 등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형식엔 동일한 원칙이 있다. 최대 원고지 20매를 넘지 않는 짧은 분량 안에, 인생의 한 장면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묘사하고, 풍자와 유머를 담고 있으며, 기발한 착상과 반전이 있는 서사로 이루어진다. 짧지만 강렬하게 이야기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는 형식이다.
소설이 외면당하는 시대에 소설가는 무엇을 쓸 수 있는가? 문학을 남달리 사랑하는 독자가 아니더라도, 평소 소설책을 즐겨 읽지 않더라도, 설령 책을 쓴 작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쯤 들춰볼 수 있고, 그러다가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소설의 숲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책. 작가는 그런 책을 염두에 두었고, 그러기에 ‘짧은 소설’ 형식을 선택했다. 『후후후의 숲』은 소설가 조경란이 5년 만에 펴내는 전작(全作)이자 첫번째 짧은 소설집이다. 여기엔 어려운 이야기도 복잡한 줄거리도 충격적인 사건도 하나 없지만 한 줄 한 줄이 놀랍고 흥미진진하다. 잘 쓰인 짧은 소설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실감하게 된다.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해보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독자들과 나누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먼저 쓰고 싶었습니다. 한 번 듣고 잊지 못한 이야기들,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살아 있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글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